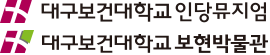-
등록된 팝업이 없습니다.
현재전시
현재전시

- 전시
- 현재전시

김인겸 : 공간의 시학_Kim In Kyum : Poetics of Space
- 전시명:김인겸 : 공간의 시학_Kim In Kyum : Poetics of Space
- 전시장소:인당뮤지엄 전시실
- 전시기간:2025-10-23 ~ 2026-01-17
- 첨부파일:
 인당뮤지엄-김인겸 도록(22.6x28).pdf
인당뮤지엄-김인겸 도록(22.6x28).pdf
장거리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총장님은 철인이네요”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건강하다는 덕담인지 게으름 부릴 명분이 없다는 불평인지 모르지만
“너무 강해”라고 들립니다.
철의 물성은 강도와 내구성으로 하중이나 압력에도 잘 견딥니다.
한번 뜻을 품으면 불리한 외부환경이나 내부의 파열음도 다독거리며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라 철인이라는 표현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철의 물성 중 연성이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 잘 늘어나고 얇게 펴지기도, 쉽게 접히거나 구부러지기도,
단단하게 압축되기도, 다른 성분과 결합해서 부식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맞닥뜨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철의 가장 큰 장점이지요.
어려운 과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지혜를 철에서 배웁니다.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유연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내 마음을 반쯤 비워 너에게도 공간을 내어주고 의지가 없이 누워있다면
소원지처럼 접어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김인겸 선생님이 비워내기의 달인인 것은 철을 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철이 곧 당신이었나봐요.
생 속이었던 철덩어리를 당신의 숙명으로 끌어안고 펴고, 접고,
비우고 누군가가 들어올 공간을 넓히고 넓혀
텅 빈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는 마술.
철의 마지막으로 꼽히는 물성은 열전도율이라지요.
김인겸 선생님의 마술로 데워진 인당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도 서늘한 가을밤의 한기를 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10월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남 성 희
전시실 전경
김 인 겸 (金仁謙, 1945-2018)
홍익대학교 조소과, 동 대학원 졸업
199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대표작가
1996-1997 프랑스 퐁피두센터 초대작가
수상
2004 김세중 조각상
1997 가나미술상
1980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개인전
2025 《김인겸: 공간의 시학》,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 대구
《Papier Sculpté, Sculpture Pliée / Sculpted Paper, Folded Sculpture》, 우손 갤러리, 대구
2023 김인겸 5주기 전 《Image-Sculpture》, Space 21, 서울
2017 《김인겸, 공간과 사유》,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2011 《스페이스리스》,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0 《스페이스리스》, 타이파 국립미술관, 마카오
2009 《스페이스리스》, 표갤러리, 서울
2005 《빈 공간》, 시공갤러리, 대구
2001 《빈 공간》, 사이트 오데옹5, 파리, 프랑스
《빈 공간》, 갤러리 모니떼르, 파리, 프랑스
1999 《묵시공간-공》, 가나아트센터, 서울
1997 《드로잉 조각》, 프랑스문화원, 서울
퐁피두센터 스튜디오, 파리, 프랑스
1996 《묵시공간-존재》, 표 갤러리, 서울
1995 《프로젝트21-내추럴 네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니 스, 이탈리아
1992 《프로젝트-사고의 벽》,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1 《묵시공간 Ⅱ》, 가나화랑, 서울
1988 《묵시공간》, 가나화랑, 서울
주요 단체전
2025 《백색 이후 1975-1995》, 홍익대학교 박물관, 서울
2024 《30 Years: Passages-백남준, 곽훈, 김인겸》, 예화랑, 서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기념전 《모든 섬은 산이다》, 몰타수도원, 베니스, 이탈리아
《삶에서 건진 아름다움의 지분》,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23 《Space·Space-Less》, The SoSo, 서울
《조각의 시간: 울림》, 세종문화회관, 서울
《또 다른 물성》,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박물관, 서울
《물은 별을 담는다》,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SeMA-Project A》, 서울시립미술관 아카이브, 서울
2022 《우리가 마주한 찰나》,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2021 《국립현대미술관 드로잉 소장품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
2018 《한국현대조각회 창립 50주년 기념전》, 홍익대학교 현대 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기증작품 특별전 2010~18》, 국립현대미술 관 과천관, 과천
《아트 파리 2018》, 그랑 빨레(Grand Palais), 파리, 프랑스
《서울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100선》,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7 《종이 조형-종이가 형태가 될 때》, 뮤지움 산, 원주
《Korea Now 2017》, 오페라 갤러리, 제네바, 스위스
2016 《아트 파리 2016》, 그랑 빨레(Grand Palais), 파리, 프랑스 2015
《물성을 넘어, 여백의 세계를 찾아서-한국 현대미술의 눈과 정신 1》, 가나아트센터, 서울
《사물의 소리를 듣다-197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의 물질성》,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Perspective on Contemporary Korean Art》, 오페라 갤러리, 파리, 프랑스
《아트 런던 15》, 런던, 영국
《소묘》, 갤러리 소소, 파주
2014 《벽-컬렉션 하이라이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3
《White & White - Dialogue Between Korea and Italy》, 카를로 빌로티 미술관, 로마, 이탈리아
《가나아트 30주년 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In Sight》, 일우 스페이스, 서울
2012 《진경》, 인터알리아, 서울
2011 《퀼른 아트페어》, 퀼른, 독일
《사각사각》, 경운박물관, 서울
《Moa Picks 2011》,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0 《백색의 봄》,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홍콩 아트페어》, 홍콩, 중국
《Sculpture 2010-트리엔날레 인천》, 인천 밀라노디자인 시티 전시관, 인천
《Inside Out》, 봉산문화회관, 석화랑, 대구
2009 《텍스타일 아트 도큐멘타 2009-섬유의 원형》, 대구문화 예술회관, 대구
《스펙트럼-리듬, 조형, 교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한국현대조각의 흐름과 양상》,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08 《베니스비엔날레 한국작가 드로잉 특별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07 《Reconstruction PURE MASS》, 서울광장, 서울
《한국현대조각의 정신-어제와 오늘》, 마나스 아트센터, 양평
《신소장품 2006》,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비평적시각 - 근·현대에서 최근까지》,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6
《서울숲 야외조각심포지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Art Now, Beyond History》, 장흥아트파크, 장흥
《김세중 조각상 창립 20주년 기념전》, 성곡미술관, 서울
《무계, Without Boundary》, 표 갤러리, 북경, 중국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개관기념 난지 야외환경조각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5 《한국현대미술초대전 - 열정》, 성남아트센터, 성남
2004 《아트 시카고》, 시카고, 미국
《현대미술의 시선》,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스틸 오브 스틸》, 포스코미술관, 서울
《신소장품 200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3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1 《횡단하는 이미지》, 갤러리 휘시, 서울
2000 《새 천년의 항로 - 주요 국제전 출품 작가들 1990-9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9 《FIAC 99》, 갤러리 가나 보부르, 파리, 프랑스
1998 《바젤 아트페어》, 가나 화랑, 바젤, 스위스
《FIAC 98》, 파리, 프랑스
《김포조각심포지움》, 김포조각공원, 김포
《가나아트센터 개관기념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잘못된 만남》, 사비나미술관, 서울
1997 《Projet 8》, 토탈미술관, 서울
《FIAC 97》, 파리, 프랑스
1996 《사라진 제국의 숨결을 찾아서 - 실크로드 미술기행》, 동아 갤러리, 서울
《FIAC 96》, 갤러리 드니스 르네, 파리, 프랑스
《에꼴드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1995 《한국미술95 - 질, 양, 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통일의 염원》, 예술의전당 미술관, 서울
《제주신라미술전》, 신라호텔, 제주
1994 《정도600주년기념 서울국제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94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오월의 환타지》, 최갤러리, 서울
1993 《작은 조각 트리엔날레》, 워커힐 미술관, 서울
《현대미술의 기호와 상형》, 갤러리 현대, 서울
《현대미술의 단면》, 표화랑, 서울
1992 《에꼴드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1991 《한국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 Ⅲ - 갈등과 대결의 시대》, 한원미술관, 서울
《아트페스티벌 후쿠오카》, 후쿠오카, 일본
《한-일 현대조각교류 10주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0 《’90 새로운 정신》, 금호미술관, 서울
《최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최갤러리, 서울
1989 《Art Jonction International》, 가나화랑, 니스, 프랑스
《작은 조각전》, 갤러리 서미, 서울
1988 《’88 올림픽기념 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7 《신라야외조각전》, 신라호텔, 서울
1986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문화예술축전 - ’86 조각대전》, 예화랑, 서울
1985 《아시아 비엔날레》, 다카, 방글라데시
1984-1992 ’84, ’85, ’87, ’92 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2-1991 《한·일 현대조각전》서울/후쿠오카, 일본
1980 《제3회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조각 11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77-2005 《한국현대조각회전》
1973-1975 제23회, 제24회, 제25회 국전 입선
Kim In Kyum (1945-2018)
B.F.A.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Department of Sculpture
M.F.A. Hongik University. The Graduate Course at College of Fine Arts, Art Education
1995 Korea Representative Artist at the Venice Biennale, Venice, Italy
1996-1997 Invited Artist by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France
Award
2004 Kim Se Choong Sculpture Prize
1997 Gana Art Award
1980 Winner of the Joong-Ang Grand Art Prize
Solo Exhibition
2025 Kim In Kyum: Poetics of Space, Indang Museum of Daegu Health Colleage, Daegu, Korea
Papier Sculpté, Sculpture Pliée / Sculpted Paper, Folded Sculpture, Wooson Gallery, Daegu, Korea
2023 Image-Sculpture, Space 21, Seoul, Korea
2017 Kim In Kyum, Space and Thought,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2011 Space-Less, Gana Art Center, Seoul. Korea
2010 Space-Less, The Taipa Houses-Museum Exhibition Gallery, Macao, China
2009 Space-Less, Pyo Gallery, Seoul, Korea
2005 Emptiness, Ci-Gong Gallery, Daegu, Korea
2001 Emptiness, Site Odéon5, Paris, France
Emptiness, Galerie Librairie du Moniteur, Paris, France
1999 Special Exhibition in Celebration of Winning of 4th
Gana Art Award-Space of Revelation-Emptiness, Gana Art Center, Seoul, Korea
1997 Dessins de Sculpture, Centre Culturel Français de Seoul, Seoul, Korea
Atelier du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France
1996 Space of Revelation-Being, Pyo Gallery, Seoul, Korea
1995 Project21-Natural Net, The 46th Venice Biennale, Korean Pavillion, Venice, Italy
1992 Project-The Walls of Thought, Th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Art Center(now Arko Art Center), Seoul, Korea
1991 Space of RevelationⅡ,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1988 Space of Revelation,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
2025 After ‘Baeksaek(白)’ 1975-1995: Critic Lee Yil, Hongik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2024 30 Years: Passages-Nam June Paik, Kwak Hoon, Kim In Kyum, Gallery Yeh, Seoul, Korea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1995-2024-Every Island is a Mountain, Palazzo Malta-Ordine de Malta, Venice, Italy
A Share of Beauty Salvaged from Lif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3 Space · Space-Less, The SoSo, Seoul, Korea
Time of Sculpture: Resonance, Sejong Art Center Museum, Seoul, Korea
Another Materiality, Hongik University Museum, Hongik Museum of Art, Seoul, Korea
Discovering the Star,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SeMA-Project A,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2 The Moments We Encounter,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2021 Drawings from MMCA Collection, Special Storag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8 5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Association - The Semicentennial Comtemporary Sculpture Exhibition, Hongik Museum of Art, Seoul, Korea
Special Exhibition for Donated Artworks of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rt Paris 2018, Grand Palais, Paris, France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ction-100 Works from Collec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Asia Contemporary Art Show HK, Conrad, Hong Kong, China
BAMA Art Fair, Bexco, Busan, Korea
2017 Paper Sculpture - Paper Taking Shape, Museum SAN, Wonju, Korea
Asia Now 2017, Paris, France
Korea Now, Opera Gallery, Geneva, Swiss
2016 Art Paris, Paris, France
2015 Beyond Materiality Pursuing the Realm of Vacancy - Eye and Mind of Korean Contmeporary Art I, Gana Art Center, Seoul, Korea
The Sound of Things: Materiality in Contemporary Korean Art Since The 1970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Perspective on Contemporary Korean Art, Opera Gallery, Paris, France
A Vision in Indefinite Space, Opera Gallery, Seoul, Korea
Art London15, London. UK
Somyo. Gallery SoSo. Paju. Korea
2014 Wall - Collection Highligh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13 White & White-Dialogue Between Korea and Italy, Museo Carlo Bilotti, Rome, Italy
Contemporary Age-30 Years with Artists, Gana Art Center, Seoul, Korea
In-Sight, Ilwoo Space, Seoul, Korea.
2012 Jingyeong, in-teralia, Seoul, Korea
2011 Art Köln, Wellside Gallery, Köln, Germany
The Box, Kyungwoon Museum, Seoul, Korea
Moa picks 2011,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Pyo Gallery, Wellside Gallery, COEX, Seoul, Korea
2010 Primavere del Bianco,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Pyo Gallery, COEX, Seoul, Korea
Art Hong Kong, Pyo Gallery, Hong Kong, China Sculpture 2010, Triennale Milano Incheon Special Exhibition Hall, Incheon, Korea
Inside Out, Bong San Cultural Art Center, Daegu, Korea
2009 Textile Art Documenta 2009, Daegu Cultural Art Center, Daegu, Korea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Pyo Gallery, COEX, Seoul, Korea
Spectrum, Sejong Museum of Art, Seoul, Korea
The Passage and Aspect of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2008 Venice Biennale Korean Artist Special Drawing, Sejong Museum of Art, Seoul, Korea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Yewon Gallery, COEX, Seoul, Korea
2007 Reconstruction PURE MASS, Seoul Plaza, Seoul, Korea
The Spirit of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Past and Present, Manas Art Center, Yangpyeong, Korea New Acquisitions 2006,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Critical Perspective - From Early Modern to Contemporary, INSA Art Center, Seoul, Korea
2006 Art Now - Beyond History, Jang Heung Art Park, Jang Heung, Korea
Seoul Forest Open Air Sculpture Symposium, Seoul Forest,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Nan-Ji Open Air Sculpture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Without Boundary - Opening Exhibition, Pyo Gallery, Beijing, China
2005 Passions - Contemporary arts Exhibition, Seongnam Art Center, Seongnam, Korea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Ci-Gong Gallery, COEX, Seoul, Korea
Exhibition of Korea Contemporary Sculpture Association, Jebiwool Museum, Kwachon, Korea Opening Exhibition of Cube space, Cube Space, Seoul, Korea
2004 Invitational Exhibition of The Association of Asia Contemporary Sculptors, Hongik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Seoul Art Fair, Pyo Gallery, Hangaram Museum of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Yewon Gallery, Pyo Gallery, COEX, Seoul, Korea
Art Chicago, Pyo Gallery, Chicago, U.S.A
Steel of Steel, Posco Art Museum, Seoul, Korea Perspective of 2004 Contemporary Fine Arts, Sejong Museum of Art, Seoul, Korea
New Acquisitions 2003,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03 Seoul Ar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Drawing-Its New Horiz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01 Traversing Image, Gallery Fish, Seoul, Korea
2000 A Passage for a New Millennium - Korean Artists of Overseas Exhibitions 1990-99,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999 FIAC ’99, Gallerie Gana Beaubourg, Paris, France
1998 Art 28 ’98 Messe Basel, Basel, Swiss
Six Artistes Coréens Contemporains, Galerie Gana Beaubourg, Paris. France
FIAC ’98, Paris, France
Gimpo Sculpture Symposium, Gimpo Sculpture Park, Gimpo, Korea
Gana Art Center Opening Exhibition, Gana Art Center, Seoul, Korea
Wrong Encounter,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1997 Projet 8, Total Museum, Seoul, Korea
FIAC ’97, Galerie Gana Beaubourg, Paris, France
1996 Silk Road Art Exhibition, Dong-a Gallery, Seoul, Korea
FIAC ’96, Galerie Denise René, Gallery Gana Art, Paris, France
Ecole de Seoul,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1995 Korean Art 1995 - Quality, Quantity, Sensa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Jeju Shilla Art Exhibition, Shilla Hotel, Jeju, Korea
1994 Commemorative Seoul International Art Festival of 600 Years after Fixation as Capital of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94 Seoul Ar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Fantasia of May, Choi Gallery, Seoul, Korea
1993 Small Sculpture Triennial ’93, Walker Hill Art Center, Seoul, Korea
1992 Ecole de Seoul,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1991 A Groping for the Identity of Contemporary Korean Art Ⅲ- A Period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Hanwon Museum of Art, Seoul, Korea
Art Festival Fukuoka, Fukuoka, Japan
The 10th Exhibition of Korea-Japan Contemporary Sculptur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990 90’Exhibition of New Spirit, Kumho Museum, Seoul Inaugural Exhibition of Choi Gallery, Seoul, Korea
1989 Art Jonction International, Nice, France
Small Sculptures, Gallery Seomi, Seoul, Korea
1988 Commemorative Exhibition of Seoul Olympic Gam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987 Open Air Sculpture Exhibition of Shilla, Shilla Hotel, Seoul, Korea
1986 Commemoartive Exhibition of 10th Asian Game, 86 Grand Sculpture Exhibition, Gallery Yeh, Seoul, Korea
1985 Asian Art Biennale, Dacca, Bangladesh
1884-92 Invited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Festival ’84. ’85. ’87. ’9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982-91 Korea-Japan Contemporary Sculpture Exhibition, Seoul, Korea/Fukuoka, Japan
1980 The 3th Joong-Ang Grand Art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culptor 11, Th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Art Center (now Arko Art Center), Seoul, Korea
1977-2005 Exhibition of Korea Contemporary Sculpture association
1973-75 Korea National Art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공간의 시학 - 김인겸의 ‘이미지 조각’
김복기 _ 아트인컬처 대표
1.
김인겸은 자신의 예술 여정의 대미를 장식했던 <스페이스리스> 시리즈를 두고 ‘이미지 조각(Image Sculpture)’이 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미지의 속성은 회화나 사진 같은 평면 예술에 더 가깝다. 그러니 ‘이미지 조각’은 그냥 조각이 아니라 ‘회화적 조각’쯤으로 해석해도 좋으리라. 회화적 요소와 조각적 요소의 혼성 혹은 융합. 여기에서 김인겸 조각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평면과 입체, 실상과 허상, 사물과 정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조각, 물리적 공간과 사유의 공간이 하나 되는 조각을 추구했다. 감각적 요소를 소멸 직전까지 밀어붙이고, 거기에 정신의 공간을 채웠다. 물질을 무화(無化)해 재현의 조각 언어를 극도로 줄이고, 존재론적 사유를 한층 확장했다.
김인겸은 이렇게 썼다. “예술이라는 스승의 만남을 위해 길을 나선 지 40년에 가까운 시간, …그 스승은 무한이었고, 영원이었다. 그리고 초월이었다.”1) 작가 스스로는 ‘정신의 영역을 열어가는 조각’이라고 했다. 그것은 조각의 물리적 조건과 공간 점유를 되도록 줄이고, 그 여백 공간을 강력하게 환기하는 작품이다. 조각의 본질은 물질을 다루는 예술 이건만, 대단히 역설적으로 김인겸은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를 말한다. 사유의 공간을 조각하는 예술가!
김인겸은 2018년에 우리 곁을 떠났다. 작품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작품이란 현전(現前)이 없다면 예술로서의 존재감도 없다. 전시는 작품 현전의 다른 이름이다. 현전은 타자의 시선을 요구한다. 타자의 시선. 여기에 예술의 영광과 비참,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전시는 마땅히 작품을 비평적으로 논증하는 자리여야 한다. 김인겸의 예술은 한국미술의 중요한 비평의 과제다. 필자는 이 논고에서 김인겸이 한국 조각사에 차지하는 위상을 조명하고자 몇 가지 의제를 제시한다.
첫째, 김인겸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추상 조각의 세례를 받았다. 당시의 ‘현대’ 미술은 추상이었다. 그의 추상은 작가적 성장과 함께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떻게 그 양식을 자기화했는가. 전통과 현대,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길항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김인겸의 조각은 형식적으로 서구의 미니멀 리즘 조각과 유사성을 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조각이다.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가.
둘째, 초기 작품에서부터 보이는 조각의 ‘회화주의(pictorialism)’ 속성이다. 그는 볼륨, 부피, 무게 같은 전통 조각의 속성, 형상의 여러 조건을 최솟값으로 돌려 재정의한다. 형태를 최소화하면서도 존재의 구조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대상의 재현에 매달리는 자연주의 혹은 대상주의에서 벗어나 비조각적, 탈조각적, 비물질적 감각이 두드러진다. 특히 그는 ‘접기(folding)’의 방법론을 구사한다. 사각이나 원통을 눌러 접은 듯한 모양새. 그리하여 공간을 최대한 점유 하지 않는 조각을 지향한다. 점유 공간을 최소화하다 보니, 조각은 더욱 납작해져 평면화되었다. 조각의 회화적 지향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는 왜 조각에 평면 요소를 끌어들였는가.
셋째, 김인겸은 조각과 함께 드로잉을 창작의 한 축으로 삼았다. 이 드로잉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에게 드로잉과 조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김인겸 조각의 ‘접기’ 방법론, 그 원천도 바로 이 드로잉이다. 여기서 언급하 는 드로잉은 당연히 ‘동사’가 아니라 ‘명사’다. 현대미술의 독립된 장르로서의 드로잉 말이다. 김인겸의 드로잉은 평면 에서 조각적 구조를 생생하게 구현한다. 평면의 입체화다. 드로잉은 ‘접기’의 조형론을 조각 이상으로 잘 보여준다. 드로잉은 시간의 축적, 비움의 형식, 존재론적 사유를 구현해낸 장이다. ‘접기’ 드로잉은 조형적 행위일 뿐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망이라는 더 높은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김인겸은 생전에 전작 도록에 버금가는 작품집을 제작했다. 『 KIM IN KYUM 』(에이엠아트, 2011)2). 그는 이 작품집에 자신의 조각 여정을 다음과 같이 시대별 주제별로 나누었다. 환기(Ventilation, 1980-1986), 묵시공간(Revelational Space, 1987-1991), 프로젝트(Project, 1992-1995), 묵시공간(Revelational Space, 1996-1998), 빈 공간 (Emptiness, 1999-2006), 스페이스리스(Space-Less, 2007-2011). 프로젝트는 단일 주제 아래 펼쳐낸 ‘전시= 작품’이라는 콘셉트의 대형 설치 혹은 건축적 작업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뒤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다른 작품 시리즈와의 연속성은 뚜렷하지 않다. 일종의 전환기의 작품이다. 그렇게 보면, 김인겸의 조각은 환기, 묵시공간, 빈 공간, 스페이스리스로 압축할 수 있다. 빈 공간과 스페이스리스는 시리즈 이름이 달라도 사실상 연장선에 있다.
김인겸은 앞의 작품집에서 자신의 작품 기점을 1980년으로 잡았다. 그럴 이유가 있다. 그는 바로 이해에 1974년부터 시작된 미술교사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다. <환기> 시리즈를 발표해,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 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작품집에 수록한 작품은 고작 7점이었다. 전업 작가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작품은 여전히 모색 중이었고, 경제적 압박과 갑작스러운 병환이 젊은 예술가의 발목을 잡았다.
초기의 <환기> 시리즈에서부터 김인겸의 예술적 유전인자를 발견할 수 있다. (작품 양식은 운명처럼 타고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삶이 운명의 연속이고, 작품은 그 삶의 산물이 아닌가. 작품 양식이 우연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귀결은 필연 이어야 한다.) 작품 <환기>는 휘문고 시절의 기억을 불러낸 것이다. 이 시절, 실내 환기를 위해 한옥의 창호지 문에 뚫어놓은 작은 사각 구멍이 김인겸의 호기심 어린 눈에 비쳤다. 이 하나의 이미지가 훗날 <환기> 시리즈의 모티프가 되었다.3) 고교 시절의 미술 선생은 추상 화가 이상욱이었다.
<환기>시리즈는 당시 미술계에 풍미했던 추상 조각과 가족 유사성이 있다. 현대 조각의 시대적 트렌드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일단 기초적인 구성(primary structures)에 기반을 둔 미니멀한 추상 조각이다. 기하학적인 형태의 돌이나 나무를 재료 삼아 평평한 입면(立面)을 반복적으로 재단하는 표현이 돋보인다. 돌이나 나무를 구부린 듯한 표현은 회화의 ‘눈속임 기법’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조각의 외형보다는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가 캔버스를 찢는 양 내부 공간의 표현에 골몰했다. 틈새, 사이 공간의 표현을 핵심적인 뉘앙스로 삼았다. 조각의 앞뒤를 뚫어 빈 공간을 만드는 이른바 ‘투과적 조각(perforated sculpture)’ 양식이 되었다. 공간 투과적 조각의 대표 작가는 바바라 헵워스(Barbara Hepworth)를 꼽을 수 있다. 윤영자, 최기원, 정관모 같은 홍익대 출신 조각가들의 작품에도 이 양식 이 등장한다.
투과적 조각은 작품의 몸체에 ‘텅 빈 공간=공동(空洞)’이나 ‘텅 빈 틈=공극(空隙)’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양괴와 내외 공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노리는 조각 표현이다. 김인겸은 대학 3학년 때 브랑쿠시(Constantin Brâncu?i)의 작품에 매료되어 추상 조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작품은 브랑쿠시나 김종영처럼 단순한 형태의 유기적 추상에 가운데가 뚫린 공동 구조의 석조였다.
창호지 문에 뚫린 사각의 구멍. 조각 내부를 관통하는 뚫린 공동 혹은 공극. 두 가지의 시각적 이미지는 의미가 상통 한다. 안과 밖, 겉과 속, 외연과 내포가 관통하고 나와 세계, 나와 타자가 만나는 창(窓)이 아닌가. 실제 작가는 <환기> 시리즈에 ‘창’이라는 부제를 붙이기도 했다. (일찍이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는 회화를 창에 비유했다. 그 에 따르면, 회화는 눈과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재단 면 같은 베일(veil)이며, 맞은편의 세계를 조망하기 위해 사각으로 잘린 창이다.) 그러고 보니 우뚝 서 있는 사각의 평평한 판은 벽이나 문 같은 모양이다. 세계를 새롭게 여는 문! 이 문의 메타포는 이후 김인겸의 작품에 꾸준히 등장한다. 사물의 작은 틈새처럼, 창처럼 크고 작은 사각 구조로, 핍쇼의 그것 처럼 작고 은밀한 구멍으로, 미지와 무한으로 통하는 빛의 세계로 작품 구석구석에 끊임없이 따라붙는다. 기억의 원점 처럼, 창작의 표지처럼, 혹은 삶의 숨통처럼…, 마침내 영원과 무한과 초월로 육박하는 문으로!
1988년에 김인겸은 <묵시공간> 시리즈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간의 땟국 같은 아르카익 정감의 표출이다. 사실 <환기>에서도 한옥 건축구조, 문, 고분 같은 전통적인 정서가 넌지시 개입되어 있었지만, <묵시공간>에서 이 모티프가 더 광범위하게 노골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전 모양이나 팔각의 수레바퀴, 옛 가옥의 문짝, 비석, 봉투 같은 옛 문화의 상징적 형상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김인겸의 작품 이력 중에서 지역정체성 혹은 모국주의(vernacularism) 정감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리즈다. 그는 말했다. “우선 나를 알아야 하고 내가 서있는 자리 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선조들의 높은 지혜와 여기서 서양과는 다른 우리 자신의 지혜를 담고 있는 묵시성을 고찰했다. 드러냄보다 은닉성에서 표현의 깊이를 느끼도록…”4)
젊은 시절 홍역처럼 한 번은 치러야 할 정체성 확인의 과정이리라. 특히 1980년대는 조각 분야에서 공동체 의식, 전통의 현대적 모색 등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김인겸도 이 시대정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묵시공간>은 <환기>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어가되 평면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했다. 볼륨보다는 면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특히 스테인 리스 스틸이나 플라이우드, 베니어판을 재료로 삼은 경우 작품은 6cm 두께의 납작한 몸체를 세우고 있다. 조각이래서 조각이지, 이제 작품의 표면은 회화의 지지체와 다를 바가 없이 얇디얇다. 조각이 회화의 차원으로 변모했다. 특히 김인겸의 조각은 하나의 시점, 이를테면 정면의 시점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조각은 회화처럼!
3.
김인겸은 1990년대에 들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1992년의 <프로젝트-사고의 벽>과 1995년의 <프로젝트 21-내추럴 네트>. 이 두 프로젝트는 기존의 조각 개념을 뛰어넘어 ‘조각적 건축’ 혹은 ‘건축적 조각’이라 해도 좋은 획기적인 도전이었다. 한마디로 컨템퍼러리 조각가로의 변신이었다. 김인겸으로서는 전기 모색기의 작품에 획을 긋고, 후기 작품으로 전환하는 이정표 같은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사고의 벽>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린 개인전 작품이다. 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곧 하나의 전시 였다. 철판 용접으로 12개의 불규칙한 사각형의 방을 제작하고 그 사이사이에 오목과 볼록의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 한 대형(2.7x9.5x17m) 작품이다. 좁은 문으로 미로 같은 길을 걸어가면, 8개의 방으로 둘러싸인 내부 중앙의 ‘사고 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방의 네 모서리에 삼각기둥을 설치해, 그 안에 촛불을 켰다. 어두컴컴한 방은 빛과 그림자, 관람객의 움직임이 거울에 투영된다. 성소(聖所)와도 같은 신비로운 명상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김인겸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사유의 공간으로 조형의 지평을 확장했다. 건축가 이일훈은 이 프로젝트의 개념과 가치를 대단히 정확하게 도해했다.5)
“단순 공간에서 체험공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단순 존재에서 명료한 존재로, 박제된 공간에서 살아있는 시간으로, 단층 구조에서 복층 구조로, 닫힌 틈에서 열린 공간으로, 불확정한 상황에서 확정적 상황으로, 단순 시(視) 감각에서 오감으로, 결국 공간, 시간, 인간으로… 자유로.”
이 프로젝트의 조형 개념은 인스톨레이션의 속성과 그대로 겹친다. 인스톨레이션이 무엇인가. ‘물건’으로서의 작품 에서 공간 혹은 ‘상황’으로서의 작품 추이에 다름 아니다. 그 방법은 ‘전시 공간의 환경화’와 ‘실제 공간의 작품화’다. 공간의 안과 밖 전체를 대상화함으로써 공간의 이화(異化)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인스톨레이션은 관객과의 쌍방 담화(dialogue), 장소성(site)의 맥락, 문화의 크로스 오버 등을 중시하는 복합적(multiple), 혼성적(hybrid)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무렵 동시대 미술은 특히 인스톨레이션의 열기에 휩싸였다. 김인겸은 한국미술에서 그 누구 보다도 일찍 인스톨레이션 시대 흐름을 구가했던 작가다.
<사고의 벽>이 보여준 김인겸의 동시대 최전선의 조형 언어는 베니스비엔날레로 이어졌다. <프로젝트 21-내추럴 네트>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전시한 작품이다. 1995년은 베니스비엔날레가 출범 100년을 맞는 해였다. 더욱 뜻깊은 일은 자르디니에 대망의 한국관을 개관했다. 커미셔너는 이일. 출품작가는 김인겸과 윤형근, 곽훈, 전수천. 윤형근을 빼고 모두 조각, 인스톨레이션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관 건축은 미술 전시 공간으로는 대단히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큐브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협소한 데다 외벽이 투명하다. 자연광이 그대로 전시장을 타고 든다. 더구나 김인겸 작품의 설치는 나선형 계단이 천장으로 올라가는 원형 공간. 기존의 건축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작품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김인겸은 이 악조건의 건축 환경을 자신의 작품 공간으로 요리했다.
김인겸이 내세운 주제는 ‘자연의 네트워크’. 먼저 반투명의 연보라색 아크릴 판재로 계단을 겹겹이 둘러쌌다. 투명한 유리 방 안에 다시 투명한 방을 만든 셈이다. 또 계단을 오르는 판재 벽에 아크릴 박스를 만들어 물을 채웠다. 물이야 말로 자연의 대명사이자 베니스라는 장소성의 상징이 아닌가. 그는 에어 펌프를 가동해 물 거품을 만들어 그 비정형적 형상과 소리까지 조형 요소로 끌어들였다. 좁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30여 개의 모니터가 쌓여 있다. 모니터 에는 물이 담겨 있는가 하면, 아크릴 박스에서 진행되는 물거품 이미지와 소리, 관람객의 움직임까지 비친다. 자연과 하이테크를 융합해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장소 특정적 설치작품이었다.
4.
베니스비엔날레 이후 김인겸은 세계 미술의 중심으로 성큼 다가섰다. 1996년 퐁피두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2년간 초청을 받았다. 그로부터 2004년까지 파리와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지속했다. 이 시기에 그는 새로운 전환 을 모색한다. 1997년의 드로잉 <드로잉 조각(Dessin de Sculpture)>이 그 시발이다. 애초에는 잡지나 리플릿, 사진 앨범 위에 먹 드로잉을 얹혔다. 특히 도시 거리 사진에 드로잉을 가미함으로써 바탕의 기존 이미지의 공간을 탈구축하는 작품을 제작했다. 이후 그는 드로잉 작품을 보다 심화하는데, 얼핏 봐도 그 형상은 <프로젝트-사고의 벽>의 철판 구조물이나 <프로젝트 21-내추럴 네트>의 투명 아크릴 판재의 겹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김인겸의 드로잉은 단순히 조각의 에스키스 수준이 아니라, 거꾸로 조각을 드로잉으로 옮긴 것이라 해도 좋다. 드로잉이니까 기본적으로 평면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평면 이상으로 강력한 입체감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조각적 드로잉이요, 드로잉적 조각이다.
자신의 작품을 ‘이미지 조각’이라고 불렀듯이, 드로잉과 조각의 긴밀한 상호작용이야말로 김인겸 예술의 요체다. 그의 드로잉은 조각과 똑같은 품과 격을 갖추고 <빈 공간> <스페이스리스> 시리즈로 전개되었다. 먹뿐만 아니라 골드, 실버 잉크를 사용하는가 하면, 스퀴즈, 스펀지를 구사하는 등 드로잉의 수사가 날로 풍성해진다. 놀랍게도 파리 시절의 드로잉은 이미 2000년대의 조각을 예고하고 있다. 드로잉에서 이미 김인겸 예술의 절정을 예감할 수 있다.
김인겸의 드로잉은 참으로 경이롭다. 말이 드로잉이지 다른 호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각가의 드로잉은 화가 의 드로잉과 차원이 다르다. 극단적인 예가 마티스(Henri Émile Benoît Matisse)와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마티스의 드로잉은 날 것 그대로의 선이다. 반면 자코메티의 드로잉은 수많은 선의 다발이다. 김인겸의 스퀴즈로 밀어 낸 드로잉은 무수한 선의 다발이다. 선이 가지런히 집적된 면이다. 신체 호흡의 긴장과 이완이 만들어내는 저 드로잉 의 궤적을 보라. 종이의 살갗에 미끄러지는 저항의 센스, 꿈틀대는 생성의 욕망, 짜릿한 찰나의 쾌감.
드로잉은 연결하고 분할하고 또 연결하고 분할한다. 마치 부드러운 망사 천이 바람에 흩날리듯 겹치고 겹치며 내달 리는 선의 다발, 면의 다발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의 표지로 우리의 감각을 콕 찌른다. 김인겸 특유의 접기(folding) 방식은 쉼 없이 생성의 구조를 펼친다. 노련한 수묵의 기운생동을 방불케하는 겹의 조형이다. 김종길은 겹치고 접치고 쌓고 포개는 이 드로잉을 ‘첩(疊)’의 조형이라 표현했다.6) 김인겸의 드로잉은 접기라는 방법 하나로 반복적 수행, 감춰진 존재의 은유, 존재의 내면화, 시간의 궤적, 투명한 비움의 형식 등을 실로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드로잉은 시각적 조형적 행위의 완결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존재론으로 이어진다. 존재의 주름!
‘주름(fold)’이라면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형이상학을 호출할 수 있다. 들뢰즈의 주름 개념은 저서 『주름-라이 프니치와 바로크(Le pli: Leibniz et le baroque)』(1988)에서 전개된 사유다. 그는 바로크 건축과 예술을 ‘주름의 예술’ 로 파악했다. 천장 장식, 옷의 천, 조각의 곡선 등은 끊임없이 접히며 외부와 내부를 연결한다. 위로는 무한히 상승하고 (정신), 아래로는 무한히 침잠한다(물질). 이 이중 운동이 동시에 접히는 것이 바로크의 세계다. 주름의 철학적 의미는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의 은유다.7) 주름을 김인겸 예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접힌 표면, 빈 공간, 보이지 않는 공 간의 구현… 김인겸의 접기는 들뢰즈의 주름처럼 존재를 열고 감추고 중첩한다. 무한히 접고 접어 열린 세계로 연결한다.
5.
21세기의 김인겸 조각은 <빈 공간>과 <스페이스리스>로 이어졌다. 이른바 ‘접기의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재료를 접기 위해서는 그 질료가 종이처럼 얇아야 한다. 납작한 면이어야 접기에 용이하다. 조각 재료로는 철판이 제격이다. 철판은 20세기 조각사에 등장해, 특히 추상 언어를 풍성하게 일구었던 재료다. 김인겸은 자주 말했다. “면을 접거나 말게 되면, 입체가 되어 일어선다.” <빈 공간>은 일체의 조각적 장치를 배제한 듯한 금욕적인 작품이다. 도무지 조각 같지 않은 조각이다. 이제 막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재료를 늘어놓은 상태처럼 보인다. 납작하게 누른 듯 바닥에 깔거나, 멍석처럼 말아서 덩그러니 놓거나, U자형이나 배 모양으로 세우거나, 살짝 구부려 벽에 기대거나, 철판을 접는 방식에 따라 공동과 공극의 구조가 열린다. 그는 이제 물감도 접고, 종이도 접고, 철판도 접는다. 그리고 공간을 만든다.
<빈 공간>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을 사용하는 작품이 자주 등장한다. 실은 <프로젝트-사고의 벽>에서 이미 시작 했다. 평평한 화면 같은 거울 면에는 외부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투영된다. 작품 내부와 외부의 쌍방 교통이다. 거울 효과를 통해 외부성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이미지 조각’이라는 김인겸 특유의 조형과 잘 부합된다. 거울이 이미지의 저장고, 또 하나의 캔버스 역할을 맡는 셈이다.
<스페이스리스>는 <빈 공간>의 접기 방식을 극대화했다. 아예 회화적 일루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사각 박스를 바짝 구부려 아예 종이처럼 납작하게 붙어버려 그림처럼 벽에 거는가 하면, 원통형 몸체가 두께를 홀쭉하게 줄여 조용히 서 있다. 조각의 표면은 스테인리스 판에 아크릴 우레탄으로 도장을 해, 광택 효과가 난다. 비물질적인 느낌을 한껏 유도한다. 특히 이 시리즈는 채색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회색, 검은색, 적갈색, 군청색 등으로 표면을 입힌 <스페이스 리스>는 마침내 조각과 회화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 2차원인지 3차원인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기묘한 조각이 아닐 수 없다.
조각은 본디 재료의 사물성(objecthood), 감상의 ‘연극성’을 특징으로 삼는 3차원 예술이다. 일찍이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는 「왜 조각은 따분한가(Pourquoi la sculpture est ennuyeuse)」라는 글에서 회화 장르와의 비교점 을 찾았다. 그에 따르면, 회화는 감상자에게 오로지 하나의 시점만을 허용하는 전문적인 예술임에 비해, 조각은 많은 시점을 한 번에 드러내는 ‘자연에 가까운’ 예술이다. 그러기에 조각은 회화보다 차원이 낮은 시시한 예술이라고 주장 했다.8) 보들레르 이후 120년,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다시 조각의 자연주의를 불러낸다. 프리드는 「예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1967년)이라는 논문에서 보들레르와 같은 논법으로 도널드 저드(Donald Judd) 류의 미니멀아트를 부정했던 것이다. 미니멀아트는 여러 시점의 감상, 지속적 시간을 요구하는 상황 의존적 작품이다. 프리드 는 이러한 특성을 ‘연극적’이라 불러 비판했다. 이것은 하나의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모더니즘 회화와 대조적 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인겸 조각의 회화적 지향은 보들레르의 자연주의와 프리드의 연극성을 훌쩍 뛰어넘는다.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조각이 회화의 상태를 지향하는 경향을 ‘회화주의(pictorialism)’라 불렀다.9) 이를테면 앤서니 카로(Anthony Caro)의 채색 철판 조각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조각적 구조에다 회화의 경험을 동시에 유도한다. 정면에서 본 그의 조각은 실제 공간 속의 모든 요소를 수직 면 회화의 직립성 속으로 압축 한다. 단순한 오브제 이상의 의미를 열기 위해 회화의 평면성, 이차원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작품은 오브제의 본성을 뛰어넘어 즉각적, 통합적 내용을 전달한다. 조각의 회화화. 이 단일한 명료성의 순간!
김인겸의 <스페이스리스>는 시각적, 감각적 의미 이상의 형이상학을 우리에게 던진다. 그가 만나고자 한 예술의 스승이 무한과 영원과 초월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 형이상학은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되는가. 그가 말했다. “내 마음에 기억된 입체를 던져놔야겠다. 그러려면 작업이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 공간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10) 그렇다. 공간이란 철학적, 존재론적 구조의 문제이지 단순히 작품이 놓이는 장소만은 결코 아니다. 그럼, 정신적 공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것은 조각에서의 회화적 지향과 통한다. 차원을 줄일수록 작가의 표현은 전제적,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수수께끼 같은 세계, 회화적 지향이다. 형이상학의 구현은 3차원 자연주의 조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따라 서 김인겸 조각을 감상하는 시선 또한 대단히 회화적일 수밖에 없다. 정면성의 시선, 일체의 환영(illusion)을 배제한 영도(零度)의 표면, 정지한 것 같은 시공간, 모노크롬과 빛의 착시, 신비한 존재의 암시, 숭고한 장….
김인겸의 조각은 납작하게 접힌 면과 비워낸 공간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힌다. 작품은 스스로의 내부와 외부를 교차하며, 현존과 부재가 겹치는 시공간을 일으킨다. 조각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생성과 변화의 장으로 성립한다. 이것은 정신의 공간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는 영혼의 예술이다. 인간 너머의 세계로 통하는 영혼의 거처. 여기에서 마침내 무한과 영원과 초월을 만날 수 있으리라. 형태이면서 동시에 형태가 아니고, 비어 있으면서도 차 있는, 공(空)과 간(間)의 존재론이 아닌가! 물성으로 영성을 노래하는 ‘공간의 시학’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1) 김인겸, 「정신적 영역으로 열어가는 조각」, 『KIM IN KYUM』, 에이엠아트, 2011, p. 8.
2) 『KIM IN KYUM』, 에이엠아트, 2011. 총 p. 308. 이 작품집은 필자가 서울문화재단의 ‘중견 미술가 우수작품 지원 사업’의 기금을 받고, 김인겸의 사비를 더해 제작했다. 시대별 주요 작품과 국내외 평론가 15명의 시대별 비평문이 실려 있다. 편집, 디자인에서부터 작가 연보에 이르기까지 작가 자신의 꼼꼼한 손길이 실렸다.
3) 『KIM IN KYUM』, p. 296.
4) 김인겸, 「작가노트」, 1988, 『김인겸, 공간과 사유』, 수원시립미술관, 2017, 재인용.
5) 이일훈, 「공간 체험 그리고 자유, 조각가 김인겸의 프로젝트에 대하며」, 『공간』, 1992. 7, 『KIM IN KYUM』, p. 147. 재인용.
6) 김종길, 「김인겸-사유하는 공간의 조각」, 네이버 캐스트>미술의 세계>한국미술산책.
7) Tanigawa Atsushi, 「Gilles Deleuze」, 『Art Fragments』, Bijutsu Shuppan Sha, 2012, pp. 300-301.
8) Tanigawa Atsushi, 「Charles Baudelaire」, 『Art Fragments』, pp. 88-89.
9) 로잘린드 크라우스, 윤난지 옮김, 『현대조각의 흐름』, 예경, 1997, pp. 224-228.
10) 김재석과의 인터뷰, 「자신의 그릇에 딱 맞는…, 더 투명하고 더 쉬운…」, 『아트인컬처』, 2017. 5, p. 98.
Poetics of Space - Kim In Kyum’s “Image Sculpture”
Kim Boggi _ Editorial Director, Art in Culture
1.
Kim In Kyum’s Space-Less series, which represents the pinnacle of his artistic career, was titled “Image Sculpture” by the artist himself. Since images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two-dimensional art forms like painting and photography, the term “Image Sculpture” could be better understood as “painterly sculpture” rather than traditional sculpture. This concept embodies a hybridization or fusion between the qualities of painting and sculpture. Here we can identify the essential nature of Kim In Kyum’s sculptural creation. He sought to create sculpture that crosses the boundaries between flat planes and three-dimensional forms,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works where physical space merges with contemplative space. He brought sensory elements to the edge of dissolution, replacing that emptiness with mental or spiritual territory. Through the nullification of material substance and the reduction of sculptural representation to its most fundamental essence, he expanded ontological inquiry to new dimensions.
Kim In Kyum reflects: “Almost four decades have elapsed since I began my journey to meet that mentor known as art... That mentor was infiniteness, timelessness, and the transcendent itself.”1) The artist characterized his work as “sculptures toward the realm of the mind.” These are pieces that intentionally reduce sculpture’s material presence and spatial footprint while intensely evoking the void left behind. Although sculpture’s fundamental nature involves the manipulation of physical materials, Kim In Kyum paradoxically expresses being through the unseen, through absence itself. He is an artist who seeks to give sculptural form to the very realm of contemplation!
Kim In Kyum breathed his last in 2018. However, his works continue to breathe, living in the present moment. Without being present, artworks lack artistic substance or significance. Exhibition is simply another term for the work’s being present. Presence requires the gaze of the other. The other’s gaze-this is where all of art’s glory and wretchedness resides. Exhibitions should properly function as venues for the critical examination and validation of artworks. Kim In Kyum’s art a critical imperative within Korean art discourse. This essay aims to propose several thematic questions that will clarify Kim In Kyum’s place in the trajectory of Korean sculptural history.
First, Kim In Kyum was initiated into abstract sculpture during his university years from the late 1960s to early 1970s. “Contemporary” art of that period was synonymous with abstraction. How did his approach to abstraction develop as he matured artistically, and how did he incorporate that style into his personal artistic language? How did he reconcile the conflict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between local characteristics and universal qualities? Kim In Kyum’s sculpture, though formally sharing similarities with western minimalist sculpture, ultimately goes beyond it. What convergences exist, and what divergences?
Second, what is notable is the “pictorialism” apparent in his sculpture from his earliest pieces.
He reinterprets the conventional sculptural characteristics—volume, mass, weight—along with the diverse formal conditions, stripping them down to their most essential elements. These are works that expose the fundamental nature of existence while reducing form to its bare minimum. Moving away from naturalism or objectivism’s commitment to representation, his work displays distinctly anti-sculptural, post-sculptural, and non-material sensibilities. Most notably, he deploys the methodology of “folding.” The forms suggest rectangles or cylinders that have been compressed and folded. He thereby pursues sculpture that claims the least possible spatial territory. In minimizing spatial occupation, the sculpture grows ever more compressed, trending toward two-dimensionality. Wha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sculpture’s pictorial inclination and the currents of contemporary art? What motivated him to incorporate planar components into sculptural expression?
Third, Kim In Kyum established drawing as a pivotal creative foundation coequal with sculpture. These drawings demand legitimate critical assessment. For him, drawing and sculpture constitut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wellspring of Kim In Kyum’s sculptural “folding” approach originates directly from this drawing practice. The drawing discussed here is, of course, conceived as a “noun” rather than a “verb”—drawing as an independent genre within contemporary artistic discourse. Kim In Kyum’s drawings achieve vivid sculptural architectures on the plane. This constitutes the spatialization of flatness. The drawings articulate the formal theory of “folding” with greater clarity than the sculptures themselves. Drawing emerges as the field where temporal stratification, the aesthetics of void, and existential contemplation find embodiment. The “folding” drawings exceed purely formal operations to invite elevated reading as ontological semantic networks
2.
Kim In Kyum compiled a comprehensive artist’s book during his lifetime that rivaled a complete works catalogue: KIM IN KYUM (aMart, 2011)2). Within this volume, he systematically delineated his sculptural trajectory across distinct periods and themes: Ventilation(1980-1986), Revelational Space(1987-1991), Project(1992-1995), Revelational Space(1996-1998), Emptiness(1999-2006), and Space- Less(2007-2011). Project encompassed monumental installations or architectural works developed under a single thematic framework as “exhibition-as-artwork” concepts. Though the importance of this Project period will be addressed separately, its connection to other series lacks clear linearity. They represent something of a transitional phase in his practice. From this perspective, Kim In Kyum’s sculpture condenses into four core movements: Ventilation, Revelational Space, Emptiness, and Space-Less. Though bearing different series names, Emptiness and Space-Less constitute a fundamental extension of the same trajectory.
In his catalogue, Kim In Kyum identified 1980 as the inaugural moment of his artistic production—with justification. This year marked his departure from the teaching profession he had maintained since 1974, launching his committed artistic endeavors. The debut of his Ventilation series brought him recognition through an encouragement award at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However, only seven works from this period were included in the catalogue. The path of the professional artist proved far from smooth. His practice continued in exploratory mode, as financial strain and unexpected illness impeded the emerging artist’s advancement.
Kim In Kyum’s genetic artistic code emerges even within the initial Ventilation series. (There exists an almost natal dimension to stylistic formation—life unfolds as a chain of destiny-like moments, and works emerge as that life’s manifestation. Though artistic style may begin in contingency, its culmination must be inevitable.) The piece titled Ventilation drew upon memories from his time at Whimoon High School. In those days, tiny square perforations made in the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doors of hanok architecture for air ventilation captured Kim the artist’s inquisitive gaze. This solitary visual impression would eventually evolve into the conceptual foundation for his Ventilation series.3) His high school art teacher was the abstract painter Lee Sang-Wooc.
The Ventilation series maintains affinities with the abstract sculptural currents that pervaded the artistic milieu of the era. It might well be characterized as the prevailing trend of contemporary sculpture. Essentially, these were minimal abstract sculptures founded upon primary structures. The expression is notable for its repetitive carving of plane from geometrically configured stone or wood materials. The apparent bending of stone or wood corresponds to the “trompe-l’oeil technique” of painting.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culpture’s exterior form, Kim In Kyum became absorbed in expressing interior space, much like Lucio Fontana’s slashing of canvas. He adopted the expression of gaps and interstitial spaces as a core nuance. This evolved into a so-called “perforated sculpture” style, piercing through the front and back of the sculpture to create hollow space. Barbara Hepworth stands as the representative artist of perforated sculpture. This style also appears in the works of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ulptors such as Youn Youngja, Choi Kiwon, and Chung Kwanmo.
Perforated sculpture generates structures of “empty space = cavities” or “vacant intervals = voids” within the work’s corpus. This represents a sculptural expression that aims for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mass and interior-exterior spatiality. Kim In Kyum became captivated by Brâncu?i’s works during his junior year of university, beginning his engagement with abstract sculpture. His graduation piece comprised a stone work featuring organic abstraction of simple forms—in the manner of Brâncu?i or Kim Chongyung— with a hollow structure pierced through the center.
The rectangular aperture pierced through the hanji paper door and the hollow cavity or void piercing the sculpture’s interior: These two visual images resonate in meaning. Are they not windows where inside and outside, exterior and interior, extension and intension interpenetrate—where self and world, self and other encounter? Indeed, the artist sometimes attached the subtitle “Window” to works in his Ventilation series. (Leon Battista Alberti famously compared painting to a window. According to the Italian artist, painting is a veil like a cutting plane existing between the eye and object, a rectangularly severed window for looking at the world beyond.) Upon reflection, the upright rectangular flat plane resembles a wall or door. A door that opens the world anew! This door metaphor persists as a recurring element throughout Kim In Kyum’s later practice. As tiny fissures in objects, as rectangular structures grand and modest like windows, as diminutive and secret orifices reminiscent of peep shows, toward worlds of light that channel into mystery and boundlessness—this element ceaselessly adheres to every aspect of his practice. As memory’s genesis point, as creativity’s sign, as existence’s vital passage... finally emerging as the portal that advances toward the eternal, the infinite, and the transcendent! A door that opens the world anew! This door metaphor persists as a recurring element throughout Kim In Kyum’s later practice. As tiny fissures in objects, as rectangular structures grand and modest like windows, as diminutive and secret orifices reminiscent of peep shows, toward worlds of light that channel into mystery and boundlessness—this element ceaselessly adheres to every aspect of his practice. As memory’s genesis point, as creativity’s sign, as existence’s vital passage... finally emerging as the portal that advances toward the eternal, the infinite, and the transcendent!
In 1988, Kim In Kyum inaugurated his debut solo exhibition featuring the Revelational Space series. Most significantly, the major shift involved the articulation of archaic sentiment, akin to time’s accumulated sediment. While traditional emotionality—hanok architectural elements, portals, ancient tombs—had already subtly infiltrated Ventilation, these motifs achieved broader and more overt crystallization in Revelational Space. Forms symbolic of historical culture appear organically—circular coin configurations, octagonal cart wheels, door panels from old houses, tombstones, and envelope forms. This represents the series most conspicuously manifesting regional identity and vernacularism within Kim In Kyum’s creative chronology. He declared: “Above all, self-knowledge was essential, as was understanding my position. Thus, I took interest in our distinctive cultural background and examined the revelational quality that embodies our forebears’ elevated wisdom and our own wisdom distinct from the West. It was intended to sense expressive profundity in hiddenness rather than disclosure...”4)
Such was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 that must be undergone once in one’s youth, like a childhood measles. The 1980s witnessed especially active currents in sculpture toward collective awareness and contemporary exploration of tradition. Kim In Kyum readily embraced this period’s zeitgeist. Revelational Space perpetuated Ventilation’s geometric configurations while amplifying their two-dimensional disposition. Plane characteristics gained precedence over volumetric properties. Particularly when using stainless steel, polywood, or veneer panels as materials, the works present flattened bodies merely 6cm thick set upright. These are sculptures only nominally—the work’s plane is now as thin as a painting’s support. Sculpture has metamorphosed into pictorial dimensions. Kim In Kyum’s sculptures naturally guide toward a single vantage point, specifically a frontal perspective. Sculpture in the form of painting!
3.
Kim In Kyum realized two Projects in the 1990s: Project—The Walls of Thought (1992) and Project 21—Natural Net (1995). These two Projects represented epoch-making challenges that transcended existing sculptural concepts, worthy of designation as “sculptural architecture” or “architectural sculpture.” In a word, this was his transformation into a contemporary sculptor. For Kim In Kyum, these served as landmark projects that drew a line under his early exploratory period and marked the transition to his later works.
Project—The Walls of Thought comprised the solo exhibition at Th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Art Center(now Arko Art Center). This singular Project functioned as the entire exhibition. The monumental work (2.7x9.5x17m) consisted of twelve irregularly configured rectangular rooms fabricated through steel plate welding, with concave and convex stainless mirrors positioned in the intervals. Traversing maze-like pathways through narrow doorways, visitors could access the interior central “Room of Thought” encircled by eight chambers.
At the room’s four corners, triangular prisms housed lit candles. The darkened chamber transformed into a realm where illumination and shadow, together with visitors’ motion, reflected upon the mirrors. This way, Kim In Kyum fashioned a mystical contemplative environment resembling a sacred sanctuary. He extended the sculptural domain into cognitive space that surpasses material boundaries. Architect E Ilhoon articulated this project’s conceptual framework and significance with remarkable accuracy.5)
“From simple space to experiential space, from fragment to totality, from mere existence to clarified being, from embalmed space to animate time, from single-layer to multi-layer structures, from closed gaps to open territories, from indeterminate to definitive situations, from simple visual sensation to all senses, ultimately to space, time, humanity... freedom.”
The sculptural conception of this project coincides precisely with installation’s characteristics.
What defines installation? It represents the transition from artwork as “objects” to artwork as spatial or “situational” phenomenon. Its methodologies encompass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exhibition space” and “artistic conversion of physical space.” Through the totalization of spatial interiority and exteriority as subject matter, it generates processes of spatial disassimilation. Moreover, installation possesses multiple and hybrid attributes that emphasize bidirectional dialogue with the audience, site-specific contexts, and cultural crossover. During this period, contemporary art was particularly swept up in installation fervor. Kim In Kyum was among the earliest artists in Korean art to embrace the currents of the installation era.
Kim In Kyum’s avant-garde sculptural vocabulary showcased in The Walls of Thought culminated in Venice Biennale. Project 21—Natural Net constituted the installation presented at the Venice Biennale’s Korean Pavilion. The year 1995 coincided with the Venice Biennale’s centenary celebration. Even more significant was the opening of the Korean Pavilion in the Giardini. The commissioner was Lee Yil. The participating artists were Kim In Kyum, Yun Hyong-keun, Kwak Hoon, and Jheon Soocheon. All except Yun Hyong-keun exhibited sculptural and installation pieces. The Korean Pavilion’s architectural configuration proves exceptionally challenging for art display purposes. It diverges substantially from white cube conventions. The constricted space possesses transparent perimeter walls. Natural light streams directly into the exhibition hall. Moreover, Kim In Kyum’s installation was situated within the circular space traversed by a spiral staircase rising toward the ceiling. Unless the preexisting architectural framework could be strategically utilized, the work’s establishment would have proven unfeasible. Kim In Kyum orchestrated this adverse architectural context into his creative domain.
Kim In Kyum’s proposed theme was “Nature’s Network.” First, the artist enveloped the staircase in layers of translucent pale purple acrylic panels. This created a second transparent room within the transparent glass chamber. He also made acrylic boxes along the panel walls ascending the staircase and filled them with water. Without doubt, water serves as nature’s quintessential symbol and embodies the site-specific emblem of Venice itself. He operated air pumps to generate water bubbles, incorporating their irregular configurations and acoustic qualities into the sculptural components. Climbing the narrow staircase to the second floor revealed approximately thirty stacked monitors. The monitors variously held water or projected bubble imagery and sounds from the acrylic boxes, together with spectators’ kinetic presence. This was a site-specific installation merging natural and technological elements to invoke ecological awareness.
4.
Following the Venice Biennale, Kim In Kyum stepped significantly closer to the central stage of the international art world. In 1996, he received a two-year invitation to the Pompidou Center’s residency program. He sustained a peripatetic existence between Paris and Seoul through 2004. Throughout this phase, he pursued fresh metamorphosis. His 1997 drawing Dessin de Sculpture initiated this trajectory. At the outset, he superimposed ink drawings upon magazines, leaflet, and photographic albums. Especially through the addition of drawings to urban street imagery, he produced works that dismantled the spatial coherence of the foundational pre-existing images. Subsequently, he deepened his drawing practice—at first glance, these forms remind us of the steel plate structures of Project—The Walls of Thought or the layered transparent acrylic panels of Project 21—Natural Net. While drawings inherently cannot escape planar properties, they reveal powerful three-dimensionality that transcends the flat plane. They are, so to speak, sculptural drawings and drawing-like sculptures. Kim In Kyum’s drawings thus exceed the level of simple sculptural esquisse—conversely, they might be understood as sculptures transposed into drawing. Though drawings fundamentally cannot transcend planar characteristics, they manifest powerful volumetric presence beyond mere surface. In other words, they are sculptural drawings and drawing-like sculptures.
As Kim In Kyum termed his works “Image Sculpture,” the profound reciprocity between drawing and sculpture forms the crux of his artistic practice. His drawings carry equivalent stature and refinement to his sculptures, evolving into the Emptiness and Space-Less series. In addition to Korean ink, he utilized gold and silver inks, deploying squeegees and sponges among other tools, continually enriching drawing’s expressive vocabulary. Surprisingly, the Paris-period drawings already foretold his 2000s sculptural work. Within these drawings, the apex of Kim In Kyum’s artistic achievement could already be intuited.
Kim In Kyum’s drawings prove genuinely awe-inspiring. While termed drawings, they indeed require alternative designation. Typically, sculptors’ drawings operate on different planes from painters’ work. Extreme cases include Henri Matisse and Alberto Giacometti. Matisse’s drawings embody raw, immediate linearity. In contrast, Giacometti’s drawings comprise clusters of innumerable lines. Kim In Kyum’s squeegee- pushed drawings constitute bundles of countless lines. They are planes where lines accumulate in an orderly manner. Observe the paths of those drawings created by the tension and release of bodily breathing. Feel the tactile resistance gliding over paper’s epidermis, the writhing desire for creation, the thrilling pleasure of the instant moment.
Drawing links and segments, then links and segments anew. As delicate mesh textile flutters in the breeze, the cascading, stratifying clusters of linear and planar elements perpetually pierce our perception as signifiers of the present progressive. Kim In Kyum’s characteristic folding method incessantly deploys generative structures. This constitutes stratified formation evocative of vital dynamism in masterful Korean ink painting. Kim Jong-gil described these drawings of superimposition, folding, accumulation and overlapping as the morphology of “cheop (疊)” or layering.6) Through the singular methodology of folding, Kim In Kyum’s drawings thoroughly manifest iterative enactment, concealed being’s metaphorical dimension, existential interiorization, time’s traces, and forms of transparent voiding. These admirable drawings therefore comprise not merely visual plastic activity’s consummation but extend toward profound ontological inquiry. This is the fold of existence!
The notion of “fold” evokes Gilles Deleuze’s metaphysics. The French philosopher’s concept of the fold constitutes philosophical thought elaborated in his book Le pli: Leibniz et le baroque (1988). He conceived Baroque architecture and art as “the art of the fold.” Ceiling ornamentation, textile drapery, sculptural curvature—these perpetually fold while connecting external and internal realms. They rise infinitely toward heights (spiritual) and descend infinitely downward (material). This binary motion folding concurrently forms the Baroque universe. The fold’s philosophical significance functions as metaphor for continuous transformation and generative process.7) The fold finds immediate application to Kim In Kyum’s artistic practice. Folded planes, vacant territories, materialization of invisible space... This way, Kim In Kyum’s folding methodology reveals, obscures, and overlaps being in the manner of Deleuze’s pli (fold). It folds infinitely, connecting to an open cosmos.
5.
Kim In Kyum’s 21st-century sculpture continued with Emptiness and Space-Less. This can be summarized as the so-called “era of folding.” To fold materials, the substance must paper-like thinness. Flat planes facilitate folding. Steel plate proves ideal as sculptural material. Steel plate emerged in 20th-century sculptural history and particularly enriched abstract vocabulary. Kim In Kyum frequently declared: “When planes fold or curve, they achieve dimensionality and stand upright.” Emptiness represents ascetic works that seem to exclude all sculptural devices. These are sculptures scarcely recognizable as sculpture. They suggest materials freshly arranged in preparation for artistic production. Laid flat against the floor as if pressed down, rolled up like a mat and left alone, erected in U-shapes or boat forms, or slightly bent and leaning against walls—depending on the method of folding the steel plate, structures of cavities and voids develop. He now folds paint, folds paper and folds even steel plate. Furthermore, the artist creates space.
Pieces employing stainless steel mirrors often appear within Emptiness. This approach originated with Project—The Walls of Thought. Exterior imagery organically reflects upon the planar, screen- like mirrored surfaces. This establishes reciprocal traffic between the work’s internal and external domains. The technique of incorporating exteriority within the work via mirror effects aligns harmoniously with Kim In Kyum’s characteristic formation termed “Image Sculpture.” The mirror functions as both image repository and alternative canvas.
Space-Less maximized the folding methods of Emptiness. It actively incorporates painterly illusion. Some square boxes are folded flat like paper and hung on the wall like pictures, while cylindrical forms quietly stand with their thickness reduced to a slender profile. The sculpture’s surface is finished with acrylic urethane coating on stainless steel, creating a polished sheen. This produces profoundly immaterial nuances. This series, in particular, actively engages with chromatic intervention. Space-Less, surfaced in gray, black, reddish-brown, and ultramarine pigmentation, ultimately negotiates the tenuous threshold between sculptural and pictorial realms. These are undeniably strange sculptures that provoke optical illusions questioning whether they are two-dimensional or three-dimensional.
Sculpture is, in essence, a three-dimensional art characterized by material objecthood and the “theatricality” of viewing experience. Charles Baudelaire, in his essay “Why Sculpture is Boring” (Pourquoi la sculpture est ennuyeuse), sought points of comparison between sculpture and painting. In his conception, painting is a specialized art that permits the viewer solely a single viewpoint, while sculpture is an art “closer to nature” that reveals multiple viewpoints concurrently. Therefore, he argued that sculpture was a trivial art inferior to painting.8) 120 years after Baudelaire, Michael Fried again invoked sculpture’s naturalism. In his 1967 essay Art and Objecthood, he employed the same reasoning as Baudelaire to reject Donald Judd-style minimal art. Here, minimal art is situation-dependent work requiring multiple viewpoints and sustained temporal engagement. Fried criticized these attributes as “theatrical.” This opposed modernist painting’s “momentary” apprehension from singular vantage points. Considered in this light, Kim In Kyum’s pictorial orientation of sculpture transcends both Baudelaire’s naturalism and Fried’s theatricality.
Rosalind Krauss designated sculpture’s orientation toward pictorial states as “pictorialism.”9) Anthony Caro’s chromatic steel sheet sculptures serve as paradigmatic examples. His pieces simultaneously elicit sculptural configuration and painterly experience. His sculpture, when viewed frontally, condenses all spatial components within actual environments into vertical pictorial uprightness. To unlock significance surpassing mere object status, it amplifies painting’s flatness and two-dimensional imagery. The work goes beyond objectual essence to convey instantaneous, integrated meaning. Sculpture’s pictorialization. This instant of singular clarity
Kim In Kyum’s Space-Less presents us with metaphysics beyond visual and sensory meaning. Had he not declared that art’s mentor he aspired to meet embodied infinity, eternity, and transcendence? How does this metaphysics achieve material embodiment? He stated: “I must cast the volumetric forms retained in my mind. To this end, the work must be more spiritual. Space is not something visible.”10) Indeed, space is a matter of philosophical, ontological structure—never merely the location where an artwork is placed. What then is spiritual space, and how is it realized? This is consistent with sculpture’s pictorial orientation. The more dimensions are reduced, the more the artist’s expression becomes despotic and exclusive. A world of enigma—a pictorial orientation. The materialization of metaphysics maintains certain distance from three-dimensional naturalistic formation. Consequently, the vision appreciating Kim In Kyum’s sculptural work necessarily becomes considerably pictorial. Frontal perspective, degree-zero surfaces that exclude illusionistic elements, seemingly suspended spatiotemporal conditions, monochromatic and luminous optical effects, mysterious existential allusion, sublime fields...
Kim In Kyum’s sculpture engages compressed folded planes and voided territories in perpetual opening and closure. The works traverse their internal and external areas, generating spatiotemporal circumstances where presence and absence intersect. Sculpture establishes itself not as mere object but as a terrain of generation and metamorphosis. This represents mental space. It embodies soul’s art that seeks to perceive the imperceptible and endeavors to manifest the invisible. The soul’s dwelling that leads to worlds beyond human reach. Here one might finally encounter infinity, eternity, and transcendence. Form yet simultaneously non-form, empty yet full—is this not the ontology of void and betweenness! How might we designate this a “poetics of space” that sings spirituality through materiality.
1) Kim In Kyum, “Sculptures Toward the Realm of the Mind”, KIM IN KYUM, aMart, 2011, p. 8.
2) KIM IN KYUM, aMart, 2011. Total 308 pages. This catalogue was published with support from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Support Project for Outstanding Works by Mid-Career Artists,” along with additional funding from Kim In Kyum himself. It presents a chronological overview of his key works, accompanied by critical essays from fifteen critics from home and abroad. From the editing and design to the detailed chronology, the book reflects the artist’s careful involvement at every stage.
3) KIM IN KYUM, op. cit., p. 296.
4) Kim In Kyum, “Artist’s Statement,” 1988, requoted from Kim In Kyum, Space and Thought, Suwon Museum of Art, 2017.
5) E Ilhoon, “Spatial Experience and Freedom: Sculptor Kim In Kyum’s <Project>,” Space, July 1992, requoted from KIM IN KYUM, op. cit., p.147.
6) Kim Jonggil, “Kim In Kyum—Sculpture of Contemplative Space,” Naver Cast > World of Art > Korean Art Stroll.
7) Tanigawa Atsushi, “Gilles Deleuze”, Art Fragments, Bijutsu Shuppan Sha, 2012, pp. 300-301.
8) Tanigawa Atsushi, “Charles Baudelaire”, Art Fragments, pp. 88-89.
9) Rosalind Krauss, translated by Yoon Nanji,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Yekyong, 1997, pp. 224-228.
10) Interview with Kim Jaeseok, “It Suits One’s Capacity Perfectly... More Transparent and More Approachable...”, Art in Culture, May 2017, p. 98.